FBI를 곤경에 빠뜨린 소련의 미국인 여간첩
[뉴스엔뷰] 쥬디스 코플론(Judith Coplon: 1921-2011)은 미국인으로 냉전 초기 소련의 공안정보기관인 NKVD(KGB의 전신)에 소속돼 활동한 미국인 여성 스파이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법무부에 근무하며 전략사무국(OSS), 연방수사국(FBI), 군 방첩대(CIC) 등이 수집한 소련 관련 정보를 소련으로 빼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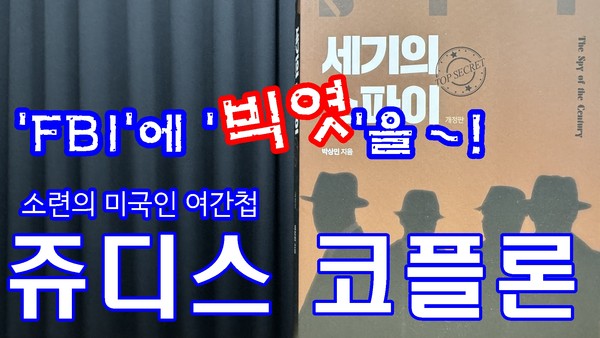
특히 코플란은 당시 미국과 영국의 통신정보기관들이 극비리에 진행하던 소련 암호해독 작전인 '베노나 계획(Project Venona)'을 통해 적발된 최초의 스파이라는 점에서 첩보사적 의미를 갖는다.
코플론은 1921년 뉴욕 브루클린(Brooklyn)에서 완구 제조업자인 아버지와 제분업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실했던 그녀는 고교시절에는 '좋은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전액 장학금을 받고 바너드 대학(Barnard College)에 입학해 역사를 전공했다.
그녀는 대학시절 공산주의에 심취해 청년 공산주의자 동맹(YCL)에 가입하고 활동했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플로라 보브친(Flora Wovschin)과 마리온 베르데시오(Marion Berdecio)라는 또 다른 공산주의자들을 만났으며 이들에 의해 소련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포섭됐다.
그녀는 1944년 미 법무부에 채용돼 OSS, FBI, CIC 등이 수집한 정보들이 모아지는 '방첩자료실(Counterintelligence Archive)'을 드나들며 정보를 빼돌렸다.
다만 당시에는 소련 정보기관에 공식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 내 공산당(CPUSA)을 돕겠다는 취지로 활동을 했었다.
그러던 1945년 1월 NKVD 뉴욕 지부장인 블라디미르 프라브딘(Vladimir Pravdin)과 만나 '시마(SIMA)'라는 암호명을 부여 받으며 정식으로 스파이가 된다.
이때부터 코플론은 NKVD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첩보원 중 한명으로 여겨지며 미국 내 소련 관련 조직에 대한 FBI의 조사 자료를 비롯해 미국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 정보 등을 빼내 소련에 넘겼다.
이렇게 그녀는 몇 년간 아무런 의심없이 미국 정부의 직원으로, 실체는 소련의 협조자로 두개의 삶을 살았다.
그러던 중 1948년 말 FBI가 코플론의 행각에 의심을 품으면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 FBI는 미 육군 통신정보국(SIS, NSA의 전신)이 소련의 암호전문을 해독하기 위해 가동 중이던 베노나 계획을 도와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 내에 '시마(SIMA)'라는 암호명을 가진 소련 스파이가 있으며, 추가 조사에서 법무부에 근무하는 코플론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소를 결정한다.
다만 수사를 담당했던 FBI 특수요원 로버트 램프레(Robert Lamphere)는 법원에 그녀의 혐의가 베노나 계획을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이에 그는 기소 근거로 보안상의 이유를 대며 출처를 '기밀 정보원Confidential Informant)'이라고만 적시했다. 문제는 이 정도로는 코플론의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코플론은 '미끼' 문서를 소지한 채 1949년 3월 뉴욕 맨해튼에서 유엔 주재 외교관으로 위장해 있던 소련 정보요원 발렌틴 구비체프(Valentin Gubitchev)를 만난다.
기회를 포착한 FBI는 그 즉시 코플론과 구비체프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듬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됐다.
코플론의 변호인단은 FBI가 기소 근거로 든 문서가 국가안보상 기밀이라는 것에 강한 의문를 제기하며, 문서를 기밀로 규정하는데 근거가 된 FBI 파일 전량을 요구하는 역공을 편다.
법원도 변호인단의 이 주장을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했다.
반면 이때 FBI는 관련 파일들이 도청, 미행 등 온통 불법적 사찰에서 얻어진 것들이라 파일을 내놓을 수 없었다. 베노나 계획에서 드러난 코플론의 활동이 담긴 소련의 암호전문은 더더욱 밝힐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FBI 국장이던 존 에드거 후버(J. Edgar Hoover)는 법원의 판단에 크게 분노하며 사건을 조기에 취하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일찌감치 모색했던 것으로 후에 알려졌다.
이에 더해 FBI가 코플론을 영장없이 체포했으며 기소 과정에는 불법 도청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불거졌고, 변호인단이 이를 빌미로 FBI를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상황이 역전된다.
때를 같이해 불어닥친 이른바 '매카시즘(McCarthyism)' 광풍으로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도 코플론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와함께 재판 과정에서 극비작전인 베노나 계획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던 FBI는 이러한 비판여론이 더해지자 재판 내내 수세적 입장을 취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 지면서 코플론은 석방된다.
이후 사건은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점쳐졌으나, 코플론의 일부 유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FBI의 의심스런 활동이 쟁점화 되면서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1967년까지 재판은 재개되지 않았고, FBI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해결을 택하며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당시 에드거 후버는 재판 과정에서 FBI의 전방위 불법사찰 활동(코인텔프로) 및 대(對)소련 극비작전인 베노나 계획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같은 해결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FBI는 2005년 발표한 공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기간에 코플론의 변호인이 베노나 계획의 실체에 접근하지 않은 것이 유일한 행운이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코플론 사건은 FBI에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이렇게 사건에서 벗어난 그녀는 소송 중에 만난 변호사 앨버트 소콜로프(Albert Socolov)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낳고 교육학 석사로 책을 출간하는 등 활동하다 2011년 사망했다.
그 사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얼마간 'KGB 공식문서' 접근이 수월했던 때가 있었다. 이 시기 비밀문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코플론을 명백한 '소련 스파이'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