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판타지로 재현한 전쟁의 잔혹상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이 출간됐다. 이 소설은 국제 아랍소설상(2014)을 수상했고 프랑스 판타지 그랜드상(2017)도 탔다.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최종후보작(2018)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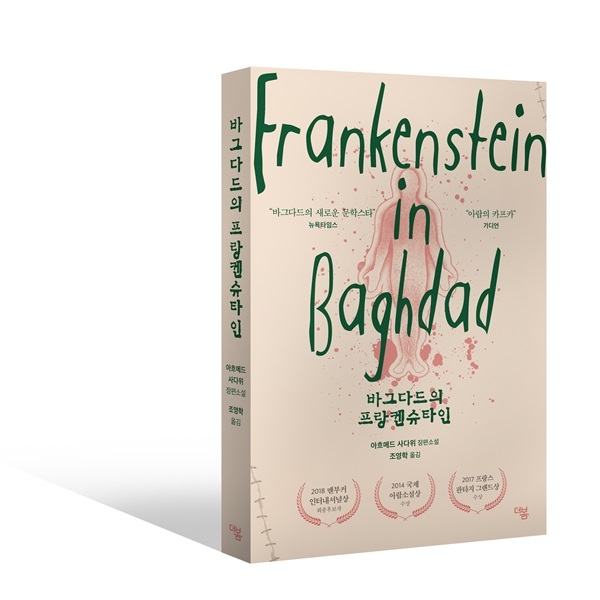
이라크 작가 아흐메드 사다위의 강렬하면서도 초현실적인 소설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에는 폭발이 많이 등장한다. 미군 점령하 바그다드에서 사람들은 쓰러지고 나뒹굴고 허공으로 날아간다.
이 같은 광기 속에 폐품업자 하디가 찰리 채플린 영화 속 부랑자처럼 등장한다. 넝마주이 하디는 단순한 인물이다. 돈이 생기면 술을 마시고 동네 창녀를 부른다. 폐품을 줍던 하디는 어느 날부터 폭발에 여기저기 흩어져나간 시체 부위들을 주워오기 시작한다. 신체 일부만 남기고 흩어진 다양한 사람들의 부위들을 꿰맨다. 이렇게 해서 온전한 몸을 만들면 누군가 장례를 치러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뀐다. 어느 날 체액을 질질 흘리던 피조물이 메모 한 장 안 남기고 사라진 것.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처참함 속에서 사다위가 구사하는 블랙유머는 독자의 방심한 틈을 파고든다.
작가는 괴물의 ‘심각한 부패문제’를 파고든다. 괴물은 일련의 살인사건의 용의자다. 정부 당국에서는 그의 외모가 끔찍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못생긴 사람들만 골라 잡아들인다. 사다위의 어조는 익살스러우나 그의 의도는 너무도 진지하다. 이 소설은 복잡한 우화이며, 미국 침공 와중에 이라크 부족 간의 잔혹상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아들과 남편을 잃고, 유품을 받고도 그들의 죽음을 부정하며 살아서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라크에서는 정말로 죽었다고 믿은 사람이 가끔 돌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 저기 동굴 속에 은신해 있던 사람들이다.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은 야밤에 사람들을 겁주는 괴물 외에도 많은 얘기를 담고 있다. 낡은 건물과 호텔을 두고 갈등을 빚으니 부동산 소설이고, 주인공 기자가 괴물 이야기를 추적하니 저널리즘 소설이기도 하다.
사다위의 목소리와 상상력은 참신하며, 한 국가의 트라우마를 풀어내는 능력도 아주 독특하다.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끔찍하면서도 일상적인 이야기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라크의 비극은 정신적 참사였다. 이 용맹하고 독특한 소설은 그 주제를 잡고 관련 의미들을 모조리 풀어내고자 한다.
바그다드의 프랑켄슈타인 / 더봄출판 / 아흐메드 사다위 지음 / 조영학 옮김



